
♧ 숭어
걷잡을 수 없이
누군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
온 몸을 튕겨
운명을 잠시
비켜서기도 하지만
그 찰나의 해갈만으론
해저의 중력이
너무 깊다
운명의 완력이
질기디
질기다

♧ 대접과 그릇
그릇이 커야 대접을 받잖아요
그래요 나 그것 밖에 안 되어요
내 대접이 줄 땐 작지 않나
내 그릇이 받을 땐 크지 않나
드러내는 것이 아니라
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존재는
그릇이나 대접이나 내공만큼
그래요 채우거나 비워내면 그만

♧ 우울
그대의 우울을 차라리 꽃이라 부르자 바다라고 산이라고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그리하여 생명이라고 부르자 그래도 정녕 못 견디겠거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자 거기 별들이 있어 깜빡이거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자 우울은 공포, 절망에 이르는 죽음의 길에조차 혼자 버려지나니, 이겨낸 그대는 더불어 꽃이 되고 생명의 벗 땀의 합창으로 나의 우울을 이름 지어 달라 바다라고 산이라고 지나가는 바람이라고, 그리하여 사랑이라고,

♧ 촌철살인寸鐵殺人
시인은
살인자다
촌철寸鐵의,
능히
비인非人을 제압하는,

♧ 입맞춤
조개 속살처럼
차나무 새순처럼 여리고
문어 빨판처럼
동백꽃처럼 강하면서
솔치회처럼
꾸지뽕 열매처럼 달콤하며
날미역처럼
생강나무처럼 알싸하고
복어처럼
독버섯처럼 현란하며
성게알처럼
복수초처럼 화안한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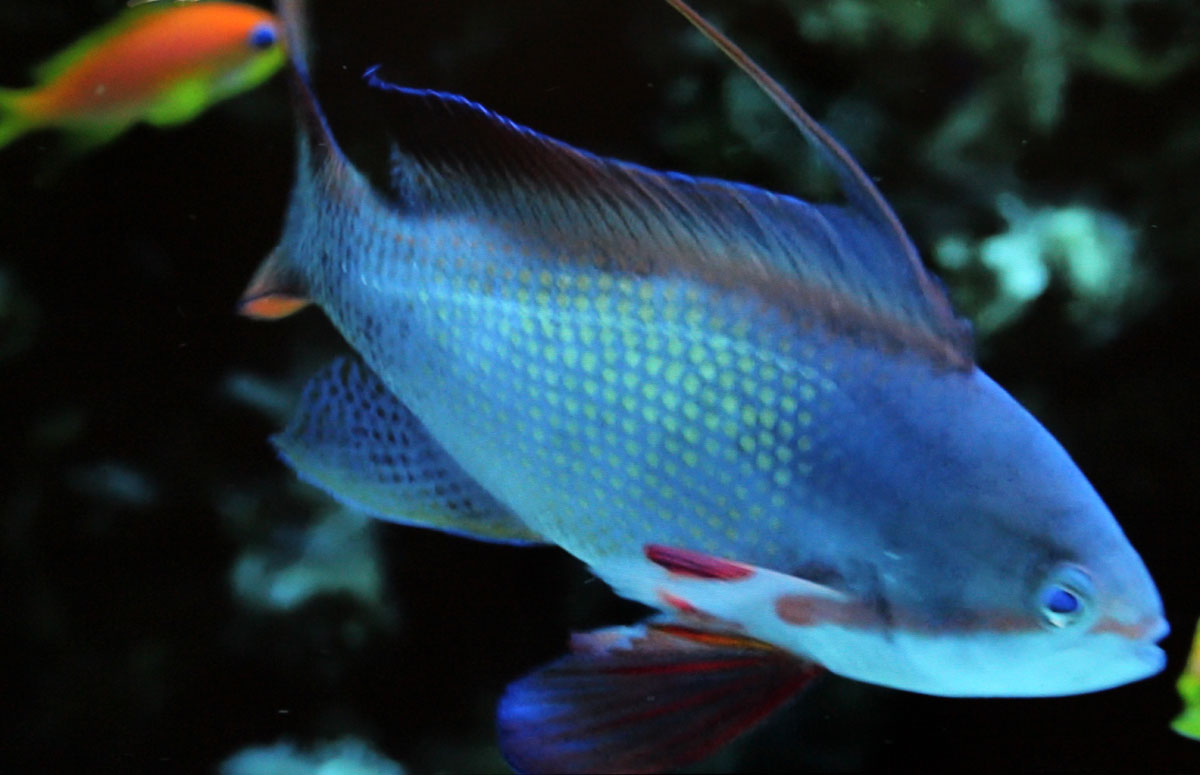
♧ 뚱딴지
몸에 좋은 거라며 건네주는
누님 손에 뚱딴지 한 푸대
겨울 산밭을 언 손으로 파냈을
그 귀한 마음덩이 덩이들
백량금 천량금 만량금보다
백리향 천리향 만리향보다
오직 귀한 금이고
살 더운 향이라네
한 뿌리 잔뜩 베어 물고
누님 언 손 먼저 녹이리
* 김경훈 시집 『수선화 밭에서』 (도서출판 각시선 046, 2021)에서
* 사진 : 바다고기(서문시장에서 회를 썰던 시인을 회상하며 내게 있는 사진을 다 뒤짐)

'문학의 향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'혜향문학' 2021년 하반기호의 시(1) (0) | 2021.12.02 |
|---|---|
| 정형무, 시집 '닭의장풀은 남보라 물봉선은 붉은보라' 발간 (0) | 2021.12.01 |
| 고영숙 시집 '나를 낳아주세요'의 시(3) (0) | 2021.11.29 |
| 양동림 시집 '마주오는 사람을 위해'의 시(2) (0) | 2021.11.28 |
| 진하, 시집 '제웅의 노래' 발간 (0) | 2021.11.27 |